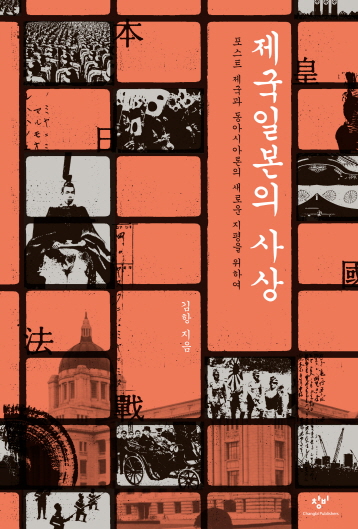
김항의 ‘제국일본의 사상’은 사상의 영역에서 이 콘크리트 밑바닥 지층을 탐사하는 작업이다. 식민지배-피지배 국가 간의 화해라는 허황된 이상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폭력과 비극을 되풀이하는 국민국가의 패러다임 밑바닥에 상존하는 제국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나약한 인간들의 공존의 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저자는 제국의 지층을 구성하는 ‘주권, 식민지, 아시아’라는 세 가지 층위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전후 일본은 서구의 주권개념을 도입해 평화헌법의 기초로 삼게 되지만 ‘주권재민’이 아닌 ‘천황주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극우파 천재작가였던 미시마 유키오는 ‘’천황폐하께 자위대를 돌려드리겠다“며 800여 명의 자위대원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할복자살한다.
저자는 이 사건을 천황제를 극복하고 근대 일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죽음의 퍼포먼스가 불가피했다는 걸 보여주는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식민지 한반도와 관련해선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과 염상섭의 ‘만세전’을 재독해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광수의 ‘전시동원 지지’를 반민족적 친일행위로 보지 않는다.
‘…친일이라는 전제 위에서 식민지 치하의 정치, 문화,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민족이 민족주의 없이는 실존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민족을 민족주의에 앞서 존재하는 불변의 실체로 간주하는 도착적 의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의 친일은 한반도에서 펼쳐진 민족주의의 한 양상이지 반민족행위가 아니다.…’ (129쪽)
저자는 근대국가를 꿈꿨던 이광수가 ‘국민되기’의 유일한 방식으로 친일을 택한 게 그의 한계였다는 걸 함께 지적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제국일본은 해적이다. 만민법상의 해적은 전 인류의 적이며 국제범죄자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고 지금도 청산을 거부하는 해적선은 이제 유령선이 되어 동아시아를 떠돈다.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일본의 사상가 타께우찌 요시미를 인용해 말한다.
노예선(해적선)의 항해를 멈추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길을 모색하는 난파선이 되라. 343쪽, 2만2000원, 창비
- 기자명 김홍배 기자
- 입력 2015.04.03 10:49
- 수정 2015.04.03 10:51
- 댓글 0

